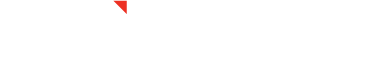한 총리의 직무 복귀 결정 時,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하는 것으로 본 것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헌법기관 구성권’을 대통령권한대행도 합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 열리나…권영호 제주대 로스쿨 교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례”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사건 선고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 총리 탄핵의 향배를 가를 쟁점이 ‘대통령권한 대행 공직자의 헌법상 신분’과 ‘그에 따른 권한 행사 범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주에 대한 명문 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현상유지설’과 ‘무제한설’이 양립해왔다.대통령의 핵심적 권한 중 하나는 바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의 주요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 ‘헌법기관 구성권’이다.이와 같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근거는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되는 유일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

-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재균 기자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본보와의 대담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 체계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에게 ‘권력을 자유위임’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국민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에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권한 행사를 자유 위임, 즉 허락했다는 논거와 사실에 기인한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권 교수는 “이와 같은 논거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 범주는 국무총리가 모든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형성됐고, 이에 기인해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 또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로 보아 그 탄핵의 정족수 또한 국회의원 2분의 1로 보아야 한다는 논거가 힘을 얻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권 교수는 “만일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선고에서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 정족수를 국회의원 3분의 2로 판단해 한 총리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헌재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아울러 권 교수는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21일 내린다면 이는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현상 유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고유의 권한 또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효시한 헌재의 결정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권한대행의 신분에 있는 공직자의 권한 행사 범주에는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권 교수는 “만일 24일 헌재가 국회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회의원의 3분의 2로 판단하고 권한대행 직무 수행의 범주를 대통령 권한 전부로 판단한다면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과는 별개로 한 총리에 대하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기관 구성권’을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 ▲ 헌법재판소 전경 ⓒ뉴시스 제공
오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사건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만일 헌재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을 회복시킨다면 그 권한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지 그로 인해 향후 탄핵정국의 향배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