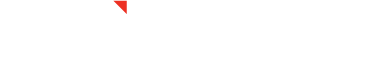영원한 감동으로의 지향, 인간과 종교
-

- ▲ 문학박사‧문학평론가‧시인 양영식.ⓒ이인호 기자
우주의 현상 계는 보이는 물질 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 물질 계로 이루어지는데, 천지와의 사이 중간에 존재하는 ‘빙의 성’을 지닌 연약한 주체로서 생각되는 외로운 介在 적 실존 체’인 데, (肉: 물질)의 세계와 ( 靈: 정신-내면 세계)를 경험하는 소 우주 적인 피조물의 존재 연유를 종교의 기원에서 살피어 보자.일찍이 종교 철학자 <엘리아데>는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 첫째 자연 발생 적 진화, 둘째 초월적인 위력에 의한 두려움의 태동, 셋째 인간 본성에서 발현된 절대자의 형상으로 이어진 자체가 곧 종교라는 성서 설, 넷째로 지배세력이 무지한 대중을 지배키 위한 부산물이라는 부정적인 설로 설명했다.그래서 종교를 인간 존재의 유한 성을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의 울림이며 초월적인 어떤 절대적인 신성으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하고, 선(善)을 지향하는 ‘사랑의 실행’ 그 중심을 일컬어 종교적 의미와 가치라 하며, 인류 공동체의 상생에 효율적이며, 그 실천력이 도덕-윤리적으로 승화 된 실체로 보았다.이처럼 보편타당한 심성과 상통 되어 어떻게 살아 갈 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주는 신앙과 체험의 중심을 인정하고 도덕을 초월하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째서 현실사회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며, 위장된 神聖에 굴종해 초월적인 것에 빌붙어 기복적인 이익 추구에 열성을 다하는 것일까.더하여 혹세무민의 위세와 형세로써 비 인간적인 종교 형태가 만연 되고 있음을 볼 땐, 때론 회의와 함께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 적인 고뇌와 공포의 근원인 ‘죽음과 삶’ 앞에서 인간은 왜 죽고 태어났는가 하는 종교의 실체인 기독교(=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 모두가 동일하리라.우선 기독교(=catholic )의 죽음이란 “원죄”의 결과로서 죽음과 영혼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우주 적 공동체에 합류 됨을, 불교 역시 세속적인 욕망에 지배 당하지 않은 각성으로서 윤회의 쳇 바퀴를 멈출 기회로써, 그리고 이슬람교에선 신 앞에 평등한 형제 애로 신앙 요소인 知 言 行을 통해 영과 세속의 세계로 연결된 강한 공동체 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유교에서는 그 연장선을 수용한 후 조상과 후손을 정신적으로 이어주는 기회로 연결된 가족 일체 관에 중심을 두는 종교란 하나같이 생사일여(生死 一如)의 가르침을 주는 ‘은유’로서 해석될 수 있기에 우리들은 ‘불가사의, 분노와 좌절’, ‘충만과 상실, ‘平凡 속의 비범’에 영성의 행보로서의 ‘평화와 영생’이란 목표를 두는 종교에 느낌과 인식은 매우 높았으리라.하지만 불가사의에서 온 “生”의 황량함 등 <전쟁과 기근, 골육상쟁과 살육, 자연 재난>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며 도래할 것 같은 불행에서 또는 재앙을 피할 기복 적 신앙에 매달림에서 벗어나, 자아를 초월하여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는 사랑의 의미가 충만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이의 함의는 종교의 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울림을 줄, 영성의 소리에 깊이 빠지어 ‘불가사의-천국, 극락. 幽玄’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참 종교의 길 <永生의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긴 여운으로서 깊은 울림의 메시지와 계시로 일관된 신앙과 사랑에 의한 신애력(信愛力)의 실천은 으뜸이 될 것이다.그러함으로써 자아와 정신 문화를 굳건히 창조하고, 가치 실현의 길로 나아가 “용서와 사랑”의 울림이 두루 두루 널리 펴지어 한 뜻으로 공명 되는 가운데 온 세상이 신애(信愛)와 교의(敎義)에 따른 거룩함과 아름다움 위에 초월 된 자아를 다시 찾게 됨으로써 창조적인 자아로 거듭나는 <신성>과 <영원한 감동>이 무궁토록 가슴 속에 <진정성>이 남아 있는 종교이어야 함을 일컫는 것일 터라 하리라.